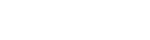[튀르키예에서 온 편지] “도시가 사라졌다”
페이지 정보
본문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간다. 세계 각 곳에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신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늑장 대응에 지지부진한 복구로 이재민의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들의 고통이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이재민이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 지진 당시의 상황과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답답한 심경이 담겨 있다. 하타이에서 아멧이 보내온 편지다.
하타이는 간혹 지진이 나는 지역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이었다. 저 멀리서부터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땅이 일렁이면서 들이닥쳤다. 좌우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위아래로 요동쳐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렇게 깜깜한 새벽에 지진은 우리를 덮쳤다. 나는 잠결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얼떨떨해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우리 집은 조금 외곽에 있어서 무너지지는 않았다. 땅이 심하게 흔들려 얼른 밖으로 뛰쳐나와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나와 다른 가족 두 명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다. 안타키야가 사라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다. 길이 부서지고 건물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또 다른 친척이 사는 시내의 아파트로 급히 뛰어갔다. 그가 살던 4층짜리 건물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삭 무너졌다.
나는 미친 듯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무너진 건물의 지붕을 냉장고가 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 안 깊숙한 어딘가에서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치고 있었다.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폐허 속으로 뛰어 들어가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구가 없었다. 장비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저 맨손으로 계속해서 파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친척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닿을 듯 가까웠다. 그러나 한쪽 다리가 콘크리트 더미에 완전히 깔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잔해를 들어올려야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을뿐더러 섣불리 치워서도 안 됐다. 만약 그것을 빼내면 잔해가 더 무너져 내리고, 깔린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추적추적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너무 추웠다. 많은 사람이 잔해 밑에 깔린 채 그렇게 추위와 사투를 벌이다 목숨을 잃었다.
지진이 난 지 이틀이 되도록 구조대는 오지 않았다. 살아남은 시민들은 잔해 속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또는 이미 차갑게 식어 버린 시신을 꺼내기 위해 노력했다. 거리는 시체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나도 친척을 구하기 위해 계속 시도했다.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친척을 구조했다. 그러나 깊은 부상을 치료해 줄 어떤 시설도 없었다. 괴로워하는 그를 그저 길가에 눕혀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친척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장례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시신을 깨끗이 닦을 물도, 감쌀 천도 구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피 묻은 옷 그대로였다.
나에게는 아내와 6개월 된 아이가 있다. 계속되는 여진에 건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우산을 쓰고 나무 아래에 피해 있었다. 정부의 구호품을 신청하기 위해 접수처로 갔다. 그들은 몇 가지 서류만 작성하고 돌아가라 했다. 임시 거처로 제공되는 천막은 이미 대기만 수백 가정이 밀려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창고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옆집은 1차 지진 후 마당에 어설픈 천막을 만들어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2차 지진으로 벽이 무너지면서 천막을 덮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얼굴을 다쳤다. 아이도 한쪽 뺨에 큰 상처를 입었다.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운이 좋으면 일거리를 받아 100-200리라(7천원~1만4천원)의 일당을 받아 가며 연명하고 있다. 이마저도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하루하루가 막막하다. 씻기는 커녕 마실 물이 없어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언제 바닥날지, 장담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물이 너무 절실하다. 거액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은 무너졌다. 은행은 이자를 6개월간 탕감해 주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집은 사방에 금이 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
[김지혜의 Interview-e] ‘부부 독도화가’ 권용섭·여영난 화백 2024.12.20
-
[오피니언] 인선에 밀려 ‘총회 정신’ 놓치지 않았나 2025.01.17
-
‘하루 총회’ 효율적 운영 VS 인선 위주 한계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