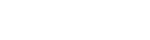주인 잃은 안수식 ... 추모비에는 눈송이만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4.01.19 00:00
글씨크기
본문
살아있다면 안수 받았을 고 전기석 목사를 추모하며

눈발이 휘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원근각지에서 교회를 찾은 400여명의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한 표정으로 교회를 찾은 이들은 저마다의 손에 꽃다발과 선물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다. 이날은 거룩한 주의 종들을 기름 부어 구별하는 동중한 목사안수예배가 열리는 날이었다.
14명의 안수목사 후보자들도 밝은 얼굴로 축하인사를 나누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미소 한편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눈빛에는 남모를 각오도 촘촘하게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신임 안수목사로서의 다짐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옆자리 어딘가에 서 있어야 할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동기이자 자랑스런 선배였고, 후배였던 고 전기석 목사.
그는 지난 2001년 7월 23일. 원주삼육중고 하기봉사단을 인솔하여 강원도 횡성지역의 영영포교회에서 활동하던 중 하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롭게 된 한 학생을 구하고, 자신은 기진하여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목회의 길을 준비하며 밝고 꿋꿋한 모습으로 삼육대학교를 졸업한지 2년 반만의 일이었다.
30세의 꽃다운 나이로 생명의 씨앗을 강팍해진 우리 마음밭에 떨구고 홀연히 먼저 떠난 친구.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들과 함께 이날 안수를 받았을 것이었다. 1020번부터 시작된 이날의 안수번호 어느 한 자리는 그의 번호였을 것이었다. 그도 여느 친구들처럼 자랑스런 안수패를 가슴에 안고 남다른 포부로 목회의 비전을 가슴에 새겼을 것이었다.
친구의 빈 자리를 남겨둔 신임 안수목사들은 예배시간 내내 짧은 생애를 통해 남긴 그의 희생과 삶의 가치를 되새겼다. 그리고는 저마다 친구의 몫까지 선교열정을 불태우리라 다짐하는 표정이었다. 그를 추억하던 동료 목회자들도 그의 숭고한 죽음이 결실로 열매 맺길 함께 기도했다.
전정권 연합회장과 김광두 총무부장도 각각 말씀과 기도에서 그의 헌신적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진 그의 사랑을 본받자고 추모했다. 성도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느덧 우리 뇌리에서 서서히 퇴색되어 가고 있던 그의 의미를 조용히 꺼내어 반추했다.
이웃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몸소 보여준 고 전기석 목사.
그는 분명 눈 위에 맨 처음 발자국을 내고 걸어간 사람이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알곡을 맺듯 이웃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자신은 기꺼이 죽음을 택한 그가 남긴 ‘작은 십자가’의 의미는 이날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삶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웅변해 주고 있었다.
그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거룩한 안수목사의 직임을 부여받던 날.
그의 이름 석자는 이제 이 땅에서 지워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아무도 찾지 않는 삼육동 신학관 앞뜰 그의 추모비에는 소리없이 눈송이만 쌓여갔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영혼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버린 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가슴에 세상 끝 날까지 남아 침묵 속에 요동칠 것이다.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부부 독도화가’ 권용섭·여영난 화백 2024.12.20
최신뉴스
-
[오피니언] 인선에 밀려 ‘총회 정신’ 놓치지 않았나 2025.01.17
-
‘하루 총회’ 효율적 운영 VS 인선 위주 한계 2025.01.17